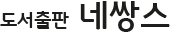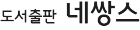10 4월 존재와 비존재
Ⅰ
세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왔다는 A가 입을 연다. “어느 버스 외벽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
There is no God. Don’t worry. Be happy.”
(하느님은 없다. 걱정 내려놓고, 행복하거라.)
옆자리의 B가 말한다. “나도 남미 어느 도시를 가다가 벽에 있는 낙서를 봤는데,
God said, “I don’t care. Just love one another and be joyful.”
(하느님 왈, 나는 아무래도 좋다. 그저 서로들 사랑하고 기뻐하려무나.)
고 적혀 있더라.” 그러자 국내에 남아있었다던 C가 담배를 물고 서성거리다 가담한다. “내 생각엔 하느님이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No, I don’t exist. Do you? Make friends with the flowers, the sunset and the stars. Touch the rocks with your hands and wipe sometimes the tears of the fellow human beings, before you will run into my non-being around the corner. One more thing. Remember that I am speaking with you.
(그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꽃과 석양, 별들과 친구가 되라. 모퉁이를 돌아서 나의 비존재와 부딪치기 전에 손으로 바위를 만져보고 가끔은 이웃인간들의 눈물을 닦아 주려무나. 한 가지 더. 내가 자네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이 말을 듣고 A와 B는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냐며 C에게 조른다. C는 자리에 앉자 맥주 한 모금을 들이키고는 멋쩍은 듯 머리를 긁으며 입을 뗀다. “글쎄, 내가 소싯적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먼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이 늘 불행해서 불행을 일으키는 것은 악마라 생각하고, 신하들을 풀어 악마를 잡아오라고 했다는군.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다 기어코 잡아 와서 임금은 인생에 있어 행복이 뭐냐고 물었다는 거야. 그런데 악마는 며칠이고 입을 굳게 닫아 사람들이 고문을 가한 연후에 그의 말을 들었다는 거야. 악마 왈, 하루살이 인생이 행복을 논하다니 참으로 가소롭다고. 임금이 다시 다그치자 악마는 ‘인생 최고의 행복은 나지 않는 거다!’고 외쳤지. 화가 난 임금은 ‘이미 태어난 사람을 갖고 놀리는 거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행복이 무어냐’고 하자 악마는 ‘일찍 죽는 거다!’고 했다지.”

C의 말은 이어진다. “유대교 경전에 보면 수 천 년 전에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친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존재’하지? 그리고 기독교 경전은 ‘이제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단언하는데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죽지 않나? 우리는 지금 확실히 존재하는 걸까? 인간의 존재는 여름밤 캠프 화이어 때 장작에서 튀어올라 짧은 궤적을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불티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하루살이 인생들의 입으로 모르는 소리를 함부로 지껄이는 풍토는 가셔야 하고, 좀 더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
알 듯도 하고 답답하다는 듯 A와 B는 재차 묻는다. “그래, 딱 잘라 너는 하느님이 있다고 보니, 없다고 보니?” “응, 하느님이 존재해도 우리는 죽을 것이고, 아니 계신다 해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하겠지. 그래서 인간은 있으나마나 하고, 하느님은 없으나마나 하다고 정의할 수 있을 거야. 그가 안 계시다면 내가 있다고 본데도 없을 것이고, 계시다면 내가 없다고 본데도 계실 터이니,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마치도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우리가 전에 어디서 뵈었지요?’ 하고 물었다가 ‘아니요’ 라는 반응이 나오자 ‘아 그래요, 우리가 아닌 어떤 두 사람이 거기서 만났겠군요.’ 하는 대꾸처럼 논리적이지만 전혀 소용없는 지껄임 같겠지.”
A가 불쑥 대든다. “하느님이 스스로 없다고 말한다니, 이게 말이 되니?” 한참 생각하던 C가 대답한다. “인간적 존재는 두뇌의 용량과 논리에 갇혀 구원을 기다리는 처지라고 한번 생각해보렴. 그러면 우리가 자신들의 비존재감을 절감할 때 누군가의 임재가 드리우고, 우리가 말없음으로 침잠할 때 어떤 태곳적 음성이 공명하는 상대성이라고나 할까? 피카소의 그림을 보는 거라고 치려무나.”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밤거리를 걸었다. 그 버스와 벽의 문구가 다 한 가지인 줄을 알면서. 그리고 모름이 아기의 강보처럼 아늑하게 느껴졌다.
Ⅱ
갠지스 강물에 들어가 전생의 죄업을 씻겠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 ‘전생과 내세는 허상이다’고 외친다면 그이들은 무어라 할까? 모르긴 해도 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물로 귀를 씻어내지 않을까? 누군가 티베트나 동남아시아의 불교사원 앞에서 ‘극락왕생은 선의의 신기루다. 정토(淨土)는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친다면 승려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르긴 해도 합장하며 특유의 미소를 선사하고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할 게다.
그런데 어떤 이가 공산국가에서 ‘하느님은 존재한다’고 외친다면 그는 즉시 수용소로 끌려가 교육이라는 것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가까웠던 친구들도 함께 끌려가 조사를 받을 게다. 그러므로 그의 행동은 용감한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이나 이라크와 같이 신의 이름으로 동족들을 마구잡이로 살육하는 국가에서 어떤 이가 ‘Allah는 거룩한 환영이다. Allah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친다면 아마 그는 돌에 맞아 죽거나 짓밟혀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이는 용감한 인간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민주사회에서 누군가 ‘신은 존재한다’거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어디로 끌려가거나 죽을 위험도 없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며 남의 견해를 존중하는 시민들은 그런 인간을 그저 싱거운 사람으로 귀엽게 보거나, 남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유아심리의 인간으로 여길 것이다. 21세기 민주사회에서 이런 부류는 성실히 제 마당을 쓰는 사람도, 용기 있는 인간도 아니다.
그러니 공공장소에서는 위세를 피우고 가까운 이들에게는 신경질을 부리는 인색한 인간이 ‘신이 있다’고 강변한다면 조용히 자리를 떠나라. 그런 자는 젖은 장작이 불에 탈 때처럼 지금 연기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세상에 조금 알려진 것을 의식하거나 재산 꾀나 모은 것을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안심으로 여기는 자가 ‘신은 없다’고 강변하면 말없이 자리를 떠라. 그런 자는 속이 거북한 것을 지금 배부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모든 이에게 겸손하고 말수가 적으며 진실된 인간이 누가 묻는 말에 ‘신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를 믿고 그이처럼 살아가라. 그는 내세가 없다 하더라도, 받은 삶을 고마워하고, 인연 맺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다 사라지려는 사람이다. 그를 따라 살면 차를 몰 때 긴 안개구간을 벗어나는 것 같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자애스러운 인간이 누가 묻는 말에 ‘하느님은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그를 믿고 그이처럼 살아가라. 그는 내세관이 뚜렷하여 ‘염려나 자책’을 끊고 ‘지금’에 우뚝 선 사람이다. 그를 따라 살면 사방이 꽃밭인 초원에 누워 해를 바라보는 것 같을 것이다.

Ⅲ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로부터 인간은 자연만물과 인생행로와 생사주변에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를 감지하여 지구상에는 민족과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신념체계가 있어왔다. 우선 불교경전에는 죽은 다음에 간다는 ‘정갈한 땅’(淨土)에 관한 언급이 무수히 많지만, ‘하느님’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유대교의 경전 구약에는 ‘하느님’은 무수히 나타나지만 ‘내세’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렵다. 그리고 힌두교는 모든 물상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하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내세에도 여러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는 사람을 물질덩어리로만 보아 죽으면 그뿐이라 하고, 내세는 동화요 하느님은 가설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하느님과 내세를 모두 품고 있는 경우이다. 그밖에 조상의 혼령만을 섬기거나 그들과 소통하는 종교도 있다. 이렇듯 인류는 참으로 가지각색의 신념체계를 꽃피워놓았다고 하겠다.
이런 정황인데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수학 또는 과학을 전공하며 먹고사는 사람들은 무신론의 공산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와 이스라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와 이탤리, 독일과 미국에도 있는 것이다. 이렇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들 과학자들은 실험할 때 ‘기도’가 필요 없듯이, 고목나무 앞에서 아이 낳게 해주십사 기원하는 여인에게 ‘식물학’이 필요 없는 줄을 아는 것이요, 연인에게서 ‘꽃’을 선사받을 때는 ‘사랑이나 고마움’을 받는 것이지, ‘얼마짜리’나 ‘분자와 세포의 집합체’를 받는 것이 아닌 줄을 아는 것이다. 이는 공자가 ‘신에게 제사할 때는 마치 신이 와 계신 것같이 하고(祭神如神在), 그 자신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를 안 지내는 것같이 했다(如不祭)’는 자세와 통하는 것이리라. 이들은 공자의 유명한 말, “신을 공경하되 멀리 하는 것이(敬鬼神而遠之) 지혜라(知)”는 경구처럼 삶에 있어서는 초월적 존재를 의식하나, 차가운 이성적 작업에는 홀로 서서 가히 지혜를 지닌 Homo Sapiens종의 대표적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신이나 하늘이란 인간의 가슴과 관련돼서 체험되는 사태이기에, 『서경』에는 ‘정성스러워야(誠)’ 신과 소통할 수 있고, ‘공경스러워야(敬)’ 하늘과 친할 수 있다는 언질이 있다. 그리고 예수도 ‘마음이 맑아야 하느님을 뵐 수 있다’고 밝히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권면도 덧붙인다. 그러니 이들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보고 나서 ‘예’나 ‘아니오’를 결론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라는 말을 듣고도 산으로 가서 ‘고기가 없더라’고 한다면 그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을 것이다. 노벨상을 시상하는 스웨덴은 국민의 94%가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루터교인들인데, 만약 누군가가 아무리 기다려 봐도 영영 상을 받지 못할 것 같자, ‘하느님은 계산을 해도, 실험을 해도 안 나오고, 천국은 망원경과 레이더로 추적해 보아도 안 잡힌다’고 투덜댄다면 이는 생물학교실에서 개구리를 해부하고서 아무리 찾아도 은하계가 없다는 투정이 아닐까?
이 시점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우리 선조들의 신념체계는 이 정황에 비추는 밝음이라 하겠다(『三一神誥』).
너희들 오가(五加)의 무리들아, 파란 것(蒼蒼)이 하늘이 아니며(非天), 까만 것(玄玄)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모양과 바탕이 없으며(無形質), 시작과 끝도 없고, 위 아래와 사방도 없어서, 비고 비어 있어(虛虛空空)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無不在) 싸지 않은 것이 없다(無不容).
‘하늘’은 망원경의 대상이 아닌 비국소(非局所)적 차원임을 옛사람들이 일찍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현대인은 멈추어 겸허해야 하리라.
신은 위 없는 으뜸자리에 계시사(在無上一位) 큰 덕과 큰 슬기와 큰 힘으로(有大德大慧大力) 하늘을 내시며(生天),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主無數世界), 많고 많은 것을 창조하셨으니, 티끌만치도 빠진 것이 없으며, 밝고도 신령하여 감히 이름하여 헤아릴 수 없다.
하느님의 품성을 전지와 전능, 은혜로 묘사하고,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만유인력을 발견한 근대과학의 창시자 뉴턴이 그의 책 결론부분에서 고백한 선언을 떠올리게 된다(『The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This most beautiful system of the sun, planets, and comets, could only proceed from the counsel and dominion of an intelligent and powerful Being. … he is supreme, or most perfect. He is eternal and infinite, omnipotent and omniscient. … He governs all things, and knows all things. …
(태양과 행성과 혜성의 이 가장 아름다운 체계는 오로지 지적이며 권능 있는 존재의 모사와 통치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다. … 그는 으뜸이시며 가장 완전하시다. 그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다. … 그는 만유를 다스리시며 만유를 알고 계신다. …)
이렇듯 동양의 옛 선각자와 근대서구의 예리한 두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지금쯤 서로 바라보며 웃지 않을까?
음성과 기운으로 원하여 빌어도(聲氣願禱) 친히 보이심을 끊나니(絶親見), 저마다의 본성에서 씨알을 찾으라(自性求子). 너희 머릿속에 내려와 계신다(降在爾腦).
예수가 말하길 하느님이 자신 안에 계시다 하고, 또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한 것처럼, 그 실재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밖이 하나인가 보다. 이는 힌두교의 표현을 빌린다면 Atman과 Brahman이 일체라는 뜻일 게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 머리에 내리는 거룩한 영의 임재이기도 할 것이다.
하늘(天)은 신국이라. 천궁(天宮)이 있어 온갖 선으로 섬돌을 삼으며(階萬善), 온갖 덕으로 문을 삼았으니(門萬德) 신께서 계시는 데요, 뭇 신령과 밝은이들이 호위하여 모시니 크게 상서로우며(大吉祥) 크게 빛나는 곳이라(大光明處). 오직 본성을 통하고(性通) 공을 마친 자라야(功完) 조회하여(朝) 길이 쾌락을 얻는다(永得快樂).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는 예수의 보장이 상기된다. 그리고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증언하는 ‘빛의 세계’와 계시록에 묘사된 천상의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그 복된 차원은 우리들 인생 각자에게 주어진 성(性)과 천명(天命)을 완성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하니, 십자가상에서 한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뜻있게 다가오지 않는가? 하느님과 사후세계를 이렇듯 간략하고도 명료하고 힘 있게 서술하는 옛 선조들의 밝음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Ⅳ
‘지동설’로 우주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각을 바꾸어 놓은 사람이 Copernicus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가톨릭의 수도사며, 법률가, 시인, 의사, 수학자라는 것을 아는 이는 얼마 없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임을 발견한 Kepler가 루터교 신학대학 출신인 줄을 아는 이도 많지 않을 것이다. Newton이 생의 많은 부분을 신학연구에 몰두하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에 심취하여 심지어 예수의 재림과 세계의 종말이 “2060년”에 일어난다고 산출했음을 아는 이는 매우 드물 것이다. 만약 태양의 평균밀도와 같은 밀도를 지닌 한 천체가 태양보다 약 500배 크다면 거기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커야한다는 계산을 통해, “그런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빛은 그리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진술로 Black Hole 개념에 최초로 눈뜬 사람이 John Mitchell 목사(1783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상대성 원리로부터 우주는 팽창해야 맞다는 확신에 도달한 이가 가톨릭의 사제이며 수학자인 George Lemaitre(1927년)라는 사실을 아는 이도 별로 없을 것이다(일반상대론을 구상한 Einstein 자신은 우주가 정적인 상태라는 신념을 지녔었다).

이들 과학의 거장들은 성서가 소개하는 하느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발견이 성서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It(universe) is written in the language of mathematics, and its characters are triangles, circles, and other geometric figures, without which it is humanly impossible to understand a single word of it.
(우주는 수학의 언어로 적혀 있고, 그 문자는 삼각형, 원 그리고 기타 기하학적 도형들이다. 이런 것들 없이는 인간으로써 우주의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다.)
고 토로한 Galileo의 말처럼 이들은 이성을 발휘해 자연의 비밀에 접근한 것이다. “사태를 숨기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이요, 이를 파헤치는 것은 왕 된 자들의 영광이라”는 잠언의 진술을 떠올리면 과학의 거장들이야말로 왕들 자리에 놓여있는 것일 테고, 무엇보다도 숨기는 측이 답을 알려줄리 만무이다. 욥을 향해 인간인 네가 바다 속의 사항이나 진귀한 생물이나 천문학적 현상에 관해 아느냐고 묻는 하느님이라면, 그는 이성을 지닌 인간들 스스로 우주에 감추어진 암호를 해독하라는 것이고, 그 자신은 가르쳐주지 않겠다는 것이 깔려있지 않은가? Copernicus, Kepler 등등 과학의 거장들은 이 도전에 응한 이들이요, 앞서 말했듯이 모두 하느님 신앙을 지니고 살아간 이들이다. 이렇듯 과학은 무신론자 마르크스가 개장한 놀이터가 아니다.
Ⅴ
어느 마을에 사냥꾼과 농부가 있었다고 하자. 그 포수는 어느 날 길을 잃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호랑이 한 마리와 눈을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 후로부터 그는 그 산속에 호랑이가 산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평생 밭만 갈던 농부는 포수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뒷산에는 호랑이가 없는 것이다. 각자의 확신을 지니고 살면 그만이니, 두 사람 모두 옳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보았다-있다’와 ‘인간들의 개발로 오래전에 사라졌다’ 혹은 ‘있을 수 없다’가 상충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인간들 앞에는 선택만이 놓여있기에.
물질로 된 우주는 모든 인간들 눈앞에 평등하게 펼쳐져 있지만, ‘천국’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포수처럼 ‘침노하는 자만이 만나는 사태’라고 예수는 밝힌다. 그리고 용을 잡으려면 자신을 미끼로 써야한다는 말처럼 하느님을 낚으려면 자신의 존재를 전적 피동의 상태인 ‘제물’로 화하여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진동시켜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이는 어느 날 기어코 호랑이와 눈을 마주치리라. 이미 예수는 밤중에 자고 있는 친구를 만나려는데 그냥 친구 사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그를 깨울 수 없고 귀찮게 해야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며 하느님 탐색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무서운 호랑이에게 들킨 경험을 한 사람, 또는 물질세계 속에서 인격성을 지닌 비물질적 에너지에 접속된 사람은 호랑이가 ‘있다’거나 ‘없다’는 논의에 대해 입을 다물 것이다. 그는 그저 호랑이의 눈빛을 가슴에 새기고 여생을 살아갈 뿐이다.
누군가 하느님을 보여달라고 당돌한 요청을 할 때 ‘나를 본 자는 곧 하느님을 본 것이다’고 확언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는 자기에게 돌아올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로지 무거운 책임만이 있다는 것쯤은 알 것이다. 그 책임감은 아마도 지구를 어깨에 메고 있다는 Atlas에 비견되리라. 그런데 인류 역사에 그렇게 장담하는 이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은 인류공동체의 특수성이 아닐까? 더구나 그분이 생물학적 죽음을 무효시킨 후에 세상 끝 날까지 자기 말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니, A. D. 1세기 이후의 역사는 이 ‘기이한 약속’ 아래에서 진행되는 현상이다. 그이는 우리가 물질차원을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며,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종당에 생물(生物)의 양태를 탈바꿈하여 생명(生命)으로 환골탈태하라는 손짓일 게다. 이런 예수의 말을 믿는 이들에게는 사람으로 와주시고 사람으로 죽어보신 ‘하느님’이 있을 뿐이요, 그가 추는 삶의 춤에 합류해 그와 함께 있을 곳을 ‘천국’이라 이름한다.